[3호] 윤리(倫理)가 밥 먹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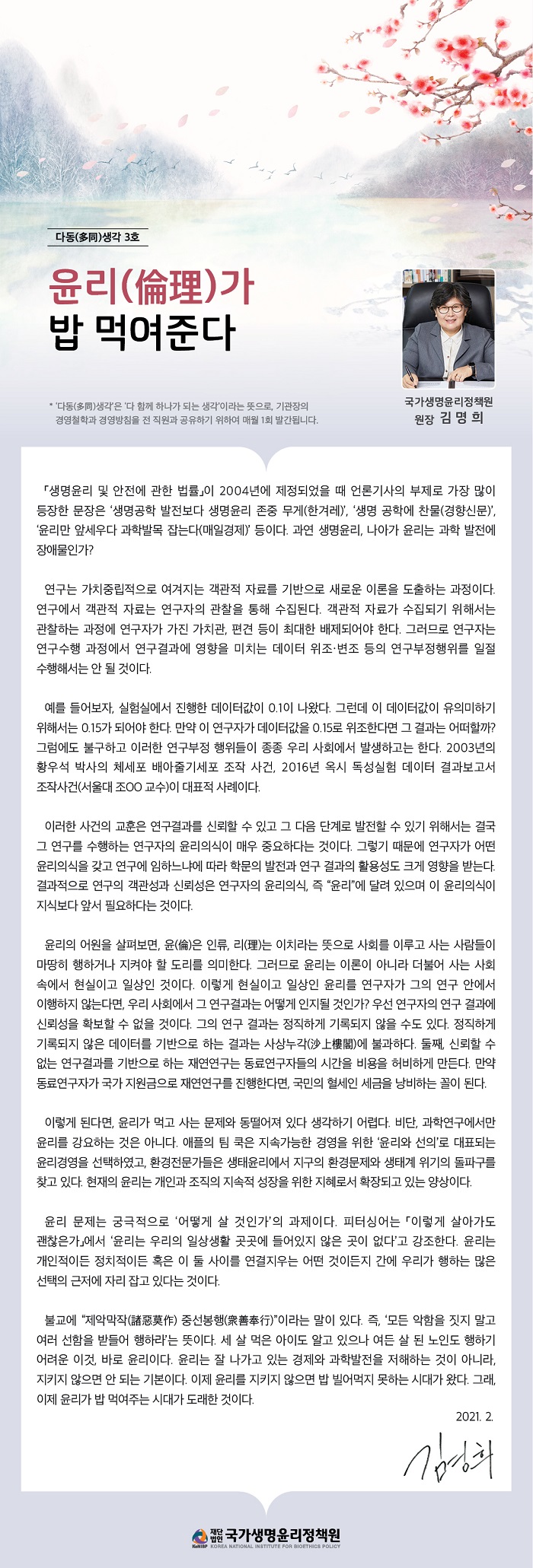
윤리(倫理)가 밥 먹여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김명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 제정되었을 때 언론기사의 부제로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은 ‘생명공학 발전보다 생명윤리 존중 무게(한겨레)’, ‘생명 공학에 찬물(경향신문)’, ‘윤리만 앞세우다 과학발목 잡는다(매일경제)’ 등이다. 과연 생명윤리, 나아가 윤리는 과학 발전에 장애물인가?
연구는 가치중립적으로 여겨지는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연구에서 객관적 자료는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수집된다.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과정에 연구자가 가진 가치관, 편견 등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위조·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일절 수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실험실에서 진행한 데이터값이 0.1이 나왔다. 그런데 이 데이터값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0.15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 연구자가 데이터값을 0.15로 위조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는 한다. 2003년의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조작 사건, 2016년 옥시 독성실험 데이터 결과보고서 조작사건(서울대 조OO 교수)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사건의 교훈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하느냐에 따라 학문의 발전과 연구 결과의 활용성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연구자의 윤리의식, 즉 “윤리”에 달려 있으며 이 윤리의식이 지식보다 앞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의 어원을 살펴보면, 윤(倫)은 인류, 리(理)는 이치라는 뜻으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윤리는 이론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현실이고 일상인 것이다. 이렇게 현실이고 일상인 윤리를 연구자가 그의 연구 안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연구결과는 어떻게 인지될 것인가? 우선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정직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직하게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둘째,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재연연구는 동료연구자들의 시간을 비용을 허비하게 만든다. 만약 동료연구자가 국가 지원금으로 재연연구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윤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기 어렵다. 비단, 과학연구에서만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의 팀 쿡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윤리와 선의’로 대표되는 윤리경영을 선택하였고, 환경전문가들은 생태윤리에서 지구의 환경문제와 생태계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현재의 윤리는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혜로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과제이다. 피터싱어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에서 ‘윤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한다. 윤리는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이 둘 사이를 연결지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선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이라는 말이 있다. 즉,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는 뜻이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으나 여든 살 된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이것, 바로 윤리이다. 윤리는 잘 나가고 있는 경제와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이다. 이제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밥 빌어먹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 이제 윤리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첨부파일
- 이미지 다동생각-3호.jpg (493.9KB / 다운로드 71)